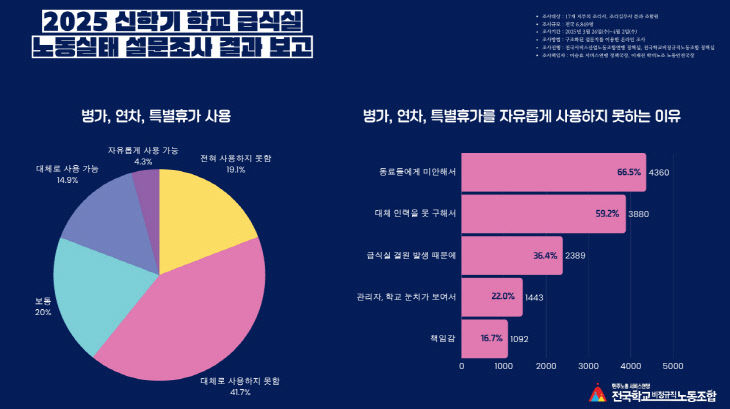애초부터 예산 삭감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가 직접 예산까지 지원할 정도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데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박할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
교원·시민단체는 물론, 학부모와 교육계 전반으로 시의회 지탄 여론이 몰아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 공립유치원 확대를 자당의 시의원들이 막아섰다는 건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이 급하게 조율에 나선 것도 커지는 시민의 힘 때문이었다.
사실 시의회가 공립유치원 예산을 자른 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 여론을 읽지 못해서다.
한국교총 조사 결과, 80%가 넘는 우리나라 학부모는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했다. 대전복지재단 조사에서도 시민의 재정지출 중 33%가 자녀양육과 교육일 정도로, 학부모에게 교육비 절감은 절실하다.
하지만, 대전 공립유치원의 원아수용률은 전국평균(26.4%)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불과하다. 교과부가 34개 학급 증설을 허락한 것도, 시설비와 인건비까지 전액 지원하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교과부에 반납하려 했다.
전국 광역시 유일하게 대전의 교육위만 예산을 삭감했다. 그것도 모자라 공개된 심사 과정에서 일언반구 없이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했다.
예결위도 마찬가지다. 심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로비 의혹을 자초했고, 무기한 정회를 통해 교육청을 길들이고, 방청을 원하는 학부모까지 막아섰다. 기계적인 법조문 해석과 교육청 길들이기만 있었다.
민의가 관철되도록 집행청과 정부를 압박해야 할 역할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본회의를 통해 여론을 반영한 일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청도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갈등 양상을 보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두달여간 계속된 사태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설명, 그리고 시의원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의회의 부도덕과 몰상식에 맞서 끈질긴 싸움을 벌인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시의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사익을 대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민의를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