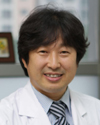 |
| ▲ 김윤식 대전대 교수, 둔산한방병원 중풍신경센터 한방내과 전문의 |
“이렇게 불편한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렇게 시작된 환자와의 대화는 한참 동안이나 지속된다. 치료를 마친 이후 환자분은 얼굴이 발그레 해지며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며 좋아하신다. 진료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니 한결 가벼워보인다. 행복감이 밀려온다.
환자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한번쯤은 서울의 빅3 병원(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혹은 빅5 병원을 가보고 싶어 한다. TV나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봐왔던 각 분야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 진찰을 받고 싶어 한다. 그분들이라면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마치 도사인양 금방 알아맞히고, 그에 딱맞는 처방을 즉시 해줄 것 같은 신뢰가 어느샌가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심지어 소원이니까 딱 한번만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호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환자들도 흔히 보게 된다.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지인도 그런 환자들 중의 한사람이다. 대전에서 다수의 교수들 처방도 받고 재야의 유명한 의사도 이미 만나본 상태다. 그분도 서울 모 병원에 근무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를 만나기를 소망했다. 보호자들은 인터넷과 아름아름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3개월을 기다려 의사의 진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일주일 후로 예약되었습니다.”
일주일후 다른 병원에서 시행되었던 MRI와 추가 검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과는 또다시 일주일 후에 나온단다.
일주일을 기다려 만나본 의사는 파킨슨이 맞다며 약물을 처방해 주셨다. “한 달 분입니다. 먹고 한 달 후에 오세요.”
기대와는 달리 증상의 변화가 없다. 한 달 후 다시 찾은 의사의 대답은 한결같다. 아니 너무 상투적이기까지 하다.
“한 달 분 더 드릴게요. 먹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을 기다려 만난 의사 앞에 무슨 뾰족한 대안이 없나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분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근엄한 표정 뒤로 쌀쌀함이 느껴질 정도다. 지인은 그 이후로 한국 최고의 권위자인 그 의사를 다시 찾지 않았다며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그분의 모습에서 서글픔이 전해온다.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을 자주 가곤 한다. 안내하는 멋지고 예쁜 아르바이트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다. 그들의 복장은 주렁주렁 어린 시절 왕자나 공주들이 달고 있을 법한 엠블럼과 장식들로 한층 멋을 더했다. 주문을 받는 모습도 특이하다. 무릎 꿇기를 서슴지 않는다. “고객님 주문하시겠습니까?”로 시작되는 주문은 한참이 지나서야 끝이 난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가보다. “필요한 것이 더 없습니까?”
나온 음식이 잘 맞는지, 고기가 잘 익혀졌는지, 음료수가 부족하지 않는지, 추가로 부탁할 것이 더 있는지, 그들의 확인공세는 지겨울 정도로 지속된다. 그러나 그 지겨움은 행복함 자체다. 가족과 나눈 대화가 한참을 무르익어 갈 때 옆에서 들려오는 생일축하 노래 소리는 마치 내가 주인공인양 기분을 고조시켜준다. 음식 맛도 일품이거니와 그들의 기쁨의 모습을 내 마음에 훔쳐오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천하를 얻은 듯 기세가 등등하다.
“와우, 오늘은 왕자나 공주한테 대접받은 기분이네.” 아이들이 이미 중학생이 되었어도 그곳의 맛있는 음식과 유쾌한 기억은 생일이나 다른 기념일에 이곳을 방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그마한 일에 상처도, 감동도 많이 받는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한다. 아침부터 시작된 진료에 피곤이 몰려오지만 퇴근길 승용차 안에서 소박한 기도 하나를 올려본다.
“주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하소서. 이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윤식 대전대 교수
김윤식 대전대 교수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118_2024112101001603200062341.jpg)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