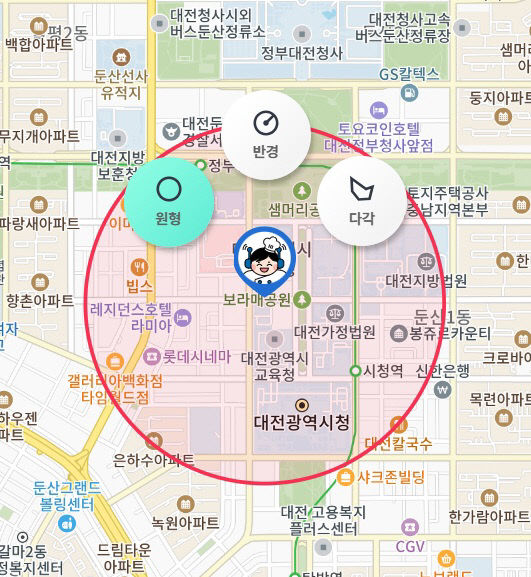|
| ▲ 김원배 목원대 총장 |
대학 생협 역시 협동조합으로 특히 그 구성원이 대학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생협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최근 생협 설립이 증가하는 경향에 비추어 대학 생협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오렌지 브랜드인 'Sunkist'(선키스트)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오렌지 생산농가의 협동조합이다. 사실 협동조합이란 것이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두레나 계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생활은 생산과 소비, 생활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제정되어 발효되는 의미 있는 해다.
그렇다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서의 생협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30여 개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있고 대전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충남대학교와 목원대학교에 생협이 설립되었다.
대학 생협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대학가에서는 학내 공간의 상업화를 막고자 학생회 중심의 생협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초기의 대학 생협은 90년대 들어 대학의 또 다른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의 3주체(학생, 교수, 직원)가 운영하는 대안적 형태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 초 우리 대학의 생협 설립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경험하게 되었다. 생협을 수요자 중심의 '싼값'의 논리로만 바라본다면, 생협은 결코 본래의 취지에 맞는 대안적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 생협은 대학 내 소비와 문화, 환경의 영역에서 기존의 경제논리에 대한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발적 협동조합이다. 즉 스스로 출자자이며, 운영자인 동시에 생협 그 자체가 공동체다.
수많은 상업시설이 학내로 들어와 있는 현실에서 '누구를 위한 수익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구성원 스스로 실천적 극복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생협의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미 생협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살피면서 구성원 중 학생의 비율이 전체조합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자칫하면 생협이 학내 사업의 운영주체로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도 학생조합원의 모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차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단순한 소비활동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예로 'Santa Barbara Student Housing Co-op'(SBSHC)는 미국 산타 바바라 학생들의 주거협동조합인데, 학생들이 처음 부모와 독립한 이후 협동조합을 통해 대학시절 공동의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도 얼만 전 한 대학의 학생들이 스스로 출자하여 만든 카페가 대형커피전문점을 이겨 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비단 '반값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험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인 사회변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전 지역 대학의 생협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는 대학생협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 지역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원배 목원대 총장
김원배 목원대 총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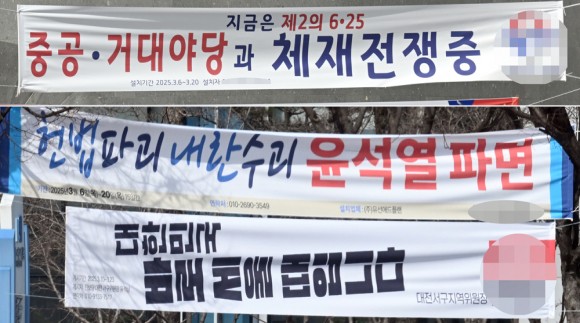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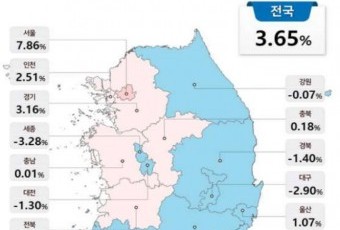







![[인터뷰]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 문화 콘텐츠 중심도시 대전을 꿈꾼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3m/11d/85_2025031101000644800024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