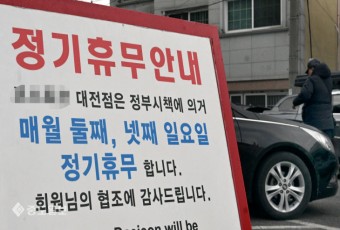설 명절과 생일에서부터 수시로 열리는 각종 모임과 행사, 연수, 답사 등에 이르기까지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 '수발'은 연중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는 대학원생의 자치기구 조차 없는데다, 있어도 학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수발문화'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본보는 초ㆍ중ㆍ고교로 집중된 감시의 눈을 대학으로 돌려 촌지와 각종 찬조금 문화가 횡행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대학원생들의 반향은 뜨거웠다.
그동안 일부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있었던 수발문화의 심각성을 실감할 정도로, 공감한다는 의견과 바꿔야 한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A 대학원생은 “1년으로 따지면, 설 명절부터 시작돼 연말 송년회까지 지도교수의 뒷바라지를 한다. 개인여행 경비까지 걷어서 낼 정도다. 물론,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지도교수가 주관하거나, 관련 있는 공식 행사는 기본이며, 심지어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선물은 신입생이 아니라 교수에게 준다.
B 대학원생은 “3월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 전원과 교수 밥값을 재학생이 갹출했다.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참석한 교수들에게 선물까지 한 건 이해 못 한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 못지않게 일부 교수를 위한 부담도 만만치않다.
석사과정인 C 대학원생은 “케이크 상자에 돈 봉투는 기본이다. 대학원생이 무슨 돈이 있느냐.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한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원에서조차 이런 문화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자정운동에 나서야 할 대학원생들의 자치기구는 거의 없거나 '존재'하기만 한다. 대학원생의 운명이 사실상 (지도)교수의 손에 달렸다는 점에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모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학생회가 있는 대학원은 2~3곳뿐이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특수한 관계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우리 학과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대학과 학과에 따라 180도 다르다”고 말했다. 국립대 박사과정의 한 대학원생은 “지성의 집단인 만큼,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영ㆍ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주영ㆍ윤희진 기자
오주영ㆍ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