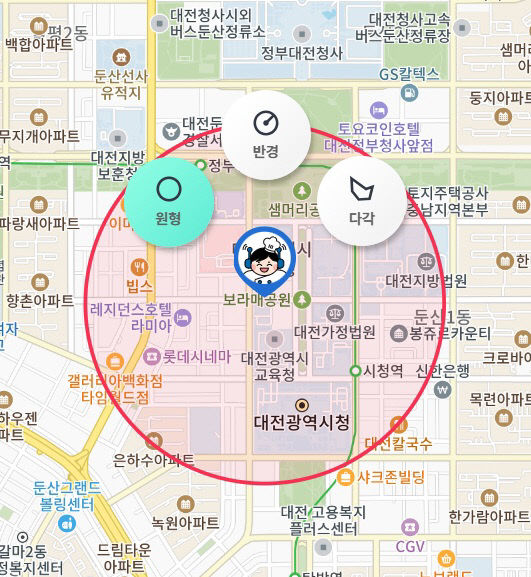사실 새주소 체계 시행 6개월이 넘도록 주민의 80% 가까이가 잘 모른다면 일단 홍보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한 주민이 12%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부 사용자마저 돈을 들여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지 의아해 한다면 이 역시 문제다. 이해 수준을 넘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을 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올해도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비를 포함해 각각 1억4400만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다. 그 이전에 지금까지 예산만 쓰고 효과를 못 내는 원인부터 철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집배원들조차 새주소와 옛주소를 동시에 모르고는 배달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뭔가 단단히 꼬인 것 아닌가.
심지어 '새주소 스트레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류 혁신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새주소 사업이 무색할 정도다. 국가경쟁력까지 높인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장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집 찾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한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단순히 생소함 때문만은 아니란 것을 의심해보라는 뜻이다. 물론 지자체의 외형적 홍보가 아닌 완벽한 홍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온적인 홍보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실제 사용 이후에 대해서도 주목해봐야 한다. 그래야 '주민밀착형'으로 한다는 홍보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시급한 것은 인지도 부족이나 활용도 저조의 원인부터 다시 분석하는 일이다. 지번형 주소와 새주소를 병기하는 현재의 방식 또한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방식은 앞뒤가 바뀌었다. 준비 단계부터 한 가지로 통일해 미리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시행상의 혼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전면 시행을 공언하지만 말고 과연 그때 순항 가능할지를 지금 점검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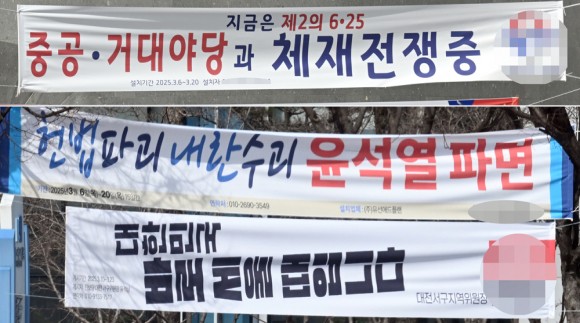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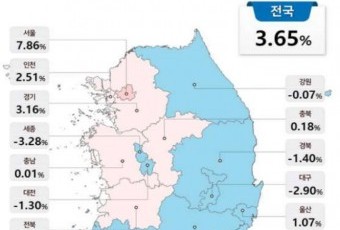







![[인터뷰]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 문화 콘텐츠 중심도시 대전을 꿈꾼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3m/11d/85_2025031101000644800024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