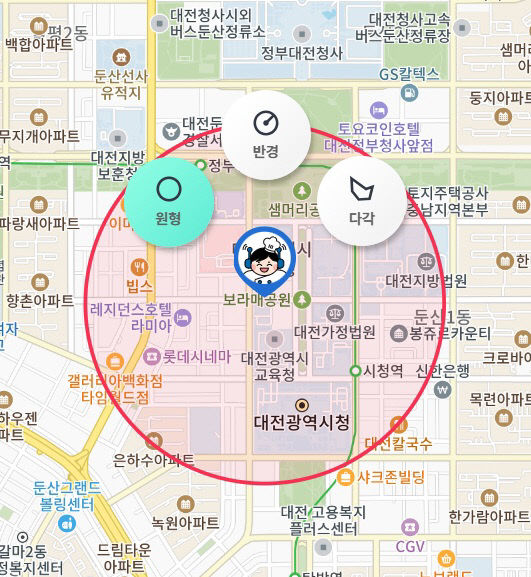지역 보건소의 기능도 막중하다. 인력이나 예산 사정으로 성인 보건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소에 학교폭력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나마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다. 일부 지역에만 정신보건 사업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만으로도 상담활동의 중요성은 입증됐다. 인턴이나 자원봉사자 활동도 도움이 되지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따른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Wee센터마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어느 경우나 청소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18일 한 재단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응답자 중 한 명도 없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도움 요청은 240명 가운에 1명이라니 있으나마나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는 이처럼 학교 또는 지역사회 현장의 부실한 상담 시스템이 배경처럼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그 심각성에 비춰 청소년 대책은 범시민운동 등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18일 대전지역 주요 기관장들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이 역시 실효성 있는 운용이 열쇠다. 특히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발성 대안이 아닌 심층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의 본질이다. 18일 대전시의회 대책회의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인용한 '아이는 동네가 키운다'는 외국 속담처럼 지역사회 전체, 범시민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학교 상담과 지역정신보건사업 모두 예산과 인프라 없이는 뜬구름 잡기 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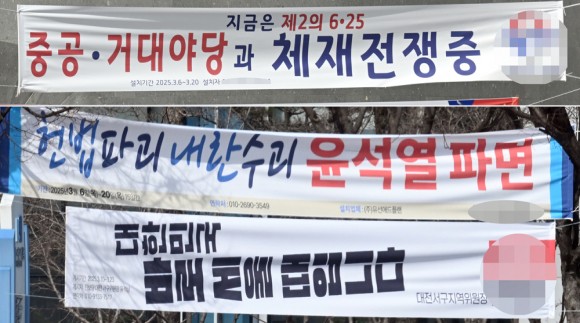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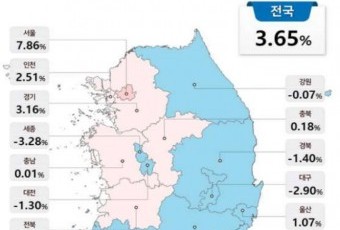







![[인터뷰]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 문화 콘텐츠 중심도시 대전을 꿈꾼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3m/11d/85_2025031101000644800024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