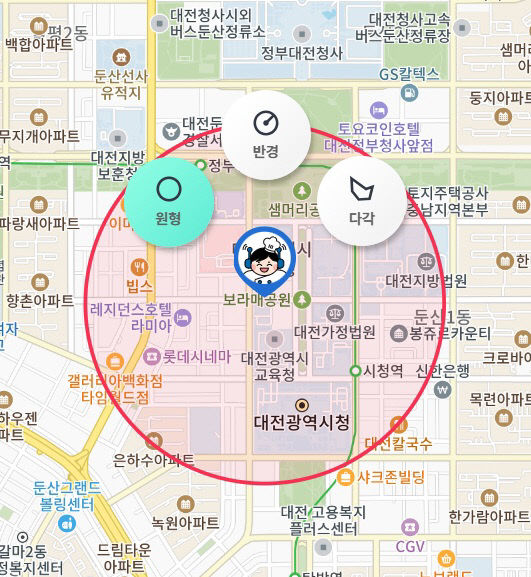|
| ▲ 이응국 주역학자·홍역사상연구소장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니 만큼 종(終)과 시(始)를 이으려는 마음이 각별했던 모양이다. 1년의 마지막 날인 섣달그믐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해를 지킨다'는 의미로 수세(守歲)라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며 마음을 경건히 했다. 올해와 내년을 이으려는 뜻에서다. 한 해의 묵은 때를 제거한다는 뜻에서 제석(除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려는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마치는 일이 선하면 새로 시작하는 일도 선한 법이다. 대개 '시종'의 용어를 순환(循環)의 의미로 '종시(終始)'라 표현한다. 종은 단지 끝이 아니요 다시 시작을 이루게 하는 인자(因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종을 귀하게 여겼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강조함이 바로 그 뜻이다.
주역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종시로 두려워하라[懼以終始]'했다. 종(終)을 삼가고 시(始)를 삼가는 것, 다름 아닌 역도(易道)를 가리킨 구절이다. 왜 그런가? 천도는 법대로 흘러가지만 인사의 도는 과불급이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뉘우칠 회(悔)'자를 강조한다. 뉘우침 속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맹자는 '근심 속에서 사는 길이 나오고[生於憂患] 안락하면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死於安]'하였다. 주역에서도 '위태로울까 여기는 자는 평안하게 되고[危者使平] 만사를 소홀이 여기는 자는 기울어지게 됨[易者使傾]'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음양의 뜻이요 종시의 상대성을 강조한 말이니 사실은 태극의 원리가 이렇다. 양이 극하면 음이 생하고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함이 태극의 원리다. 도대체가 궁함이 없기 때문에 태극의 원리를 '무궁(無窮)'이라 하였다. '궁즉통(窮則通)'의 원리, 본래 천도의 유행이 그러하니 『주역』에서는 '마치면 다시 시작을 두는 것이 하늘의 운행[終則有始天行也]'이라 하였다. 주역이 미제괘(未濟卦)로 마친 것이 또한 이 뜻이다. 세상사가 태극의 원리처럼 무궁하게 순환하므로 기제괘로 끝맺지 않고 미제괘로 종을 삼은 것이다. 그런데 미제괘 맨 끝 구절에 음주(飮酒)를 말했다. '정성을 두고 음주한다면 허물이 없겠지만 머리를 적실 정도로 마신다면 정성을 둠에 바름을 잃을 것이다[上九는 有孚于飮酒ㅣ면 ?咎어니와 濡其首ㅣ면 有孚애 失是하리라. 象曰 飮酒濡首ㅣ 亦知節也ㅣ라]' 연말에 사람들이 송년(送年)을 말하면서 함께 술 마시는 것처럼 주역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한 해를 마치는 자리, 즉 '종즉유시(終則有始)'하는데 술을 필요로 하지만 본래 술 자체에 서로를 통(通)하게 해주는 뜻이 있다. 수작(酬酌)이 주역 속에서 나온 용어인데, 주인이 손에게 헌(獻)하면 손님이 주인에게 올리는 것이 작(酌)이요 주인이 손님에게 다시 잔을 돌리는 것이 수(酬)다. 주역은 미래를 알 수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으니 내가 신에게 묻는 것을 수(酬)라 한다면 신이 나에게 답하는 것이 작(酌)이다. 제사에 술을 쓰는 것은 물론 남녀의 관계에서도 수작이라 표현하니, 실은 수작은 예(禮)로써 가능한 것이지 지나치면 해가 된다. 술은 예를 갖추고 적절히 마시면 '백약(百藥)의 장(長)'이 되지만 지나치면 광약(狂藥)이 된다. 더 심하면 '망신주(亡身酒)'가 되기도 한다. 술을 또 우물(尤物)이라고도 말한다. '훌륭한 물건'이라는 뜻이다. 이를 빗대서 옛사람들은 미녀를 가리키기도 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여자가 덕이 있으면 세상을 빛내겠지만 덕의(德義)를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을 해치지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술도 우물이기 때문에 제례와 향음례에도 사용되지만 지나치면 오륜을 알지 못하게 되고 성품을 손상하게 된다. 요컨대 술이란 예를 갖춘 가운데라야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응국 주역학자·홍역사상연구소장
이응국 주역학자·홍역사상연구소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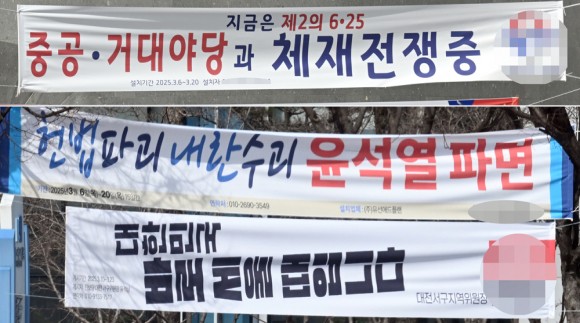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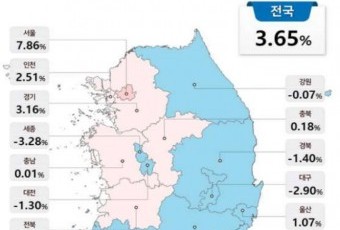







![[인터뷰]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 문화 콘텐츠 중심도시 대전을 꿈꾼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3m/11d/85_2025031101000644800024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