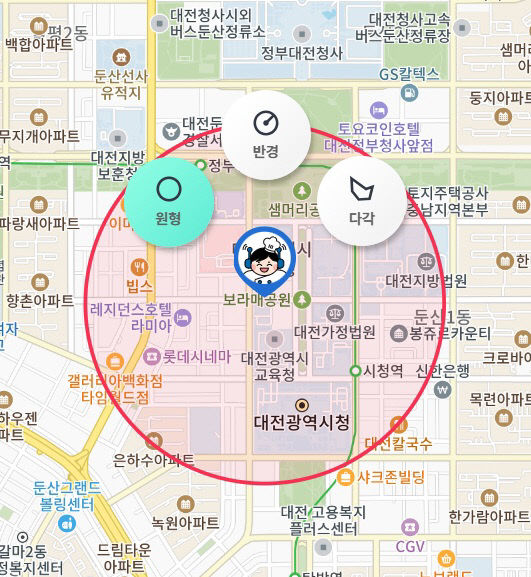|
| ▲ 우난순 교열팀장 |
오직 한 여자, 캐서린 어윈쇼를 사랑한 순정의 사나이 히스클리프는 그녀에게 버림받고 세상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사랑이 깊으면 증오도 강한 법.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히스클리프의 가장 고통스런 파괴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죽음을 초래한다.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는 죽음은 사랑의 진실이므로 그것은 '순수한 악'이라고 애도했지만 순수하고 순결한 폭풍의 언덕엔 '워더링 하이츠'가 폐허로 남아 있다.
비가 내린다. 겨울비가 세찬 바람에 흩날린다. 비내리는 겨울밤의 대지에 적막이 깊다. 터질듯한 봄의 불협화음을, 신록이 나부끼는 유월의 싱그러움을, 호수에 비치는 가을하늘의 성숙함을 좋아하지만 헐벗은 풍경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겨울의 허탈함은 우주의 존재이유를 담고 있다. 겨울은 죽음과 부활,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가 대비되는 계절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육신에 허기를 느끼고 갈증을 느낄 때 밥이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음의 공허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를 자각하게 한다. 인간의 영원한 욕망과 덧없는 삶을 오가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는 겨울의 황량한 풍경을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다. '세한도'를 처음 봤을 때 한겨울의 스산함이 너무 강렬해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다. 썰렁한 배경에 늙은 소나무와 잣나무 몇그루 그리고 야트막하고 조그만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자리한 한 폭의 동양화. 이 황량하고 메마른 분위기가 자아내는 고독한 정서는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어린시절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추사는 미래가 보장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추사는 반대파 세력의 음모에 휘말려 제주도에 유배되는 신세가 된다. 안동 김씨 세력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추사는 정적에겐 싹을 잘라야 하는 불안의 대상이었다. 추사는 정적의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실패자가 됐다. 크리스티아네 취른트는 “인간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했다. '오이디푸스 왕'처럼 불행이라는 운명은 멈추게 할 수도 없으며 최악이라도 면하려는 시도까지 실패한다고 했다.
추사에게 제주도 유배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풍토가 맞지 않아 잦은 병치레에다 절친한 친구 황산과 아내와의 영원한 이별은 추사의 심신을 쇠약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거기다 반대파들의 끊임없는 박해까지. 추사의 삶은 외롭고 궁핍했을 터다. 그러나 고독은 괴로움의 한 원인이지만 동시에 창작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동기가 된다.
문인화의 걸작 '세한도'에 그려진 썰렁한 집 한 채와 나무 몇그루는 당시 추사의 불우했던 처지를 짐작케한다. 적막감이 감도는 텅 빈 집. 그것은 추사의 한없는 외로움의 상징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눈 앞의 권세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서 명성과 세속의 안락함을 잃은 추사의 '경험의 앎'이다. 오이디푸스가 눈이 멀어 얻게 된 인식은 죽음이 아닌 확장된 삶의 경험이라고 한 취른트의 견해와 상통한다.
20여년전 전두환씨 내외가 백담사로 유배가던 날, 부인 이순자씨는 차에 오르며 손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잠깐동안의 유배생활은 그들에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밖에 안됐다. 유배를 갔다와도, 구치소에 수감됐어도 전두환씨는 뉘우친 기색이 없어보였다. “전 재산 29만원”이라는 전씨는 여전히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
1년 후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취임 전부터 도곡동 땅, BBK부터 시작해 얼마전 내곡동 사저까지, 논란이 끝이 없다. 내곡동 사저논란과 관련해 “내가 살 집 내가 마련한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 대통령은 진화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설마 전씨처럼 백담사로 유배가기야 하겠냐만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현 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격'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회 장로인 이 대통령은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유의 집착을 버리는 순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난순 교열팀장
우난순 교열팀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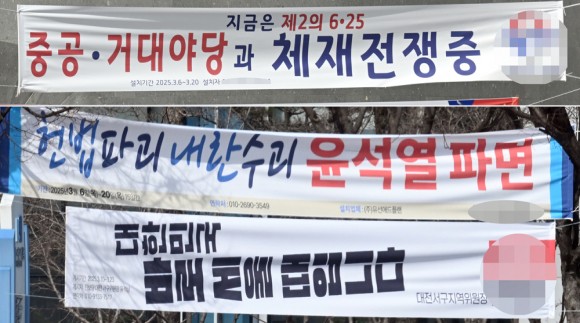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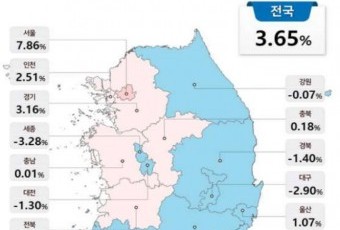







![[인터뷰]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 문화 콘텐츠 중심도시 대전을 꿈꾼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3m/11d/85_2025031101000644800024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