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된 대청호가 고향인 김기동(56·보은군 회남면)씨는 자신의 고향이 물속에 잠기기 시작한 80년대 직후부터 고향 지킴이 노릇을 해왔다. 벌써 30년째다.
하루 500여명이 넘는 낚시꾼들이 대청호변을 드나들다 보니 버려진 쓰레기들을 쳐다만 볼 수 없었다는 김씨는 누구 하나 시키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진해서 청소를 시작했다.
첫해에는 혼자 시작했던 청소지만,“쓸쓸하게 나가는 뒷모습이 안타까워 혼자 보낼 수 없었다”는 부인 한명옥(50)씨도 그 다음해부터 따라나섰다.
그때 나이 김씨는 27살, 부인 한씨는 21살로 '너무 꽃다운'시절 이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 갈등도 많았다. 아무런 댓가도 없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봉사활동은 너무 이상적인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매년 장마철이 지나면 대청댐에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쓰레기 위를 걸어다녀도 물 속에 빠지지 않을 정도다. 많을 때는 1년에 2~3만 가마니가 쌓일 정도의 엄청난 양이다.
장마철에는 쓰레기를, 겨울에는 대청호변 산속에 쌓여있는 농약병들을 줍느라 30여년의 시간을 소요했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기관지가 나빠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인 한씨는 고사목과 각종 농약병에 긇힌 다리의 상처 때문에 한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지 못한다.
쓰레기 독으로 피부병을 달고 살았고 물속에 잠긴 고사목들을 베느라 목숨을 잃을 뻔 한 아찔한 일도 있었다.
두 아들이 방학이면 부부를 도와 많은 일을 함께 했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만류도 여러번 했다.
김씨가 동네에서 10여년간 이장을 보면서 지역 일에 앞장서자 환경 미화원 추천도 제의가 왔었고, 환경청에서 지정한 토지 관리원 일도 제의가 들어왔었다.
하지만 모두 뿌리쳤다. 직업을 갖게 되면 대청호 지킴이 일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
“대청댐으로 충남·북 500만 인구와 대전 150만명의 사람들이 식수를 공급받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뿌듯한 느낌이 더 커요~”
한두 사람이 지킨다고 해서 대청호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한 수질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이다.
수거한 농약병과 유리병을 팔아 독거노인과 노인정에 쌀과 연료를 사다주기도 한다는 김씨 부부는 정부로부터 선행상도 여러번 받았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가득한 요즘, 김씨 부부의 따뜻한 실천으로 세상은 한결 아름답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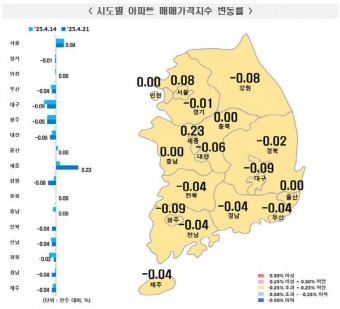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