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독재시절 국가의 지상과제는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했다.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을 경고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조차 불순한 세력의 사주로 둔갑돼 위협받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수 십 년에 걸쳐 진행돼 만성화 됐으며 관리부실로 훼손돼 복구라는 명목으로 수십 수백 배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내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충남은 지난 50년 간 태안군 면적보다 넓은 1억5600만평의 임야가 자취를 감췄으며 최근에도 해마다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1200만∼1500만평의 숲이 사라지는 실정이다.
화재라는 관리부실에 의한 산림파괴는 더욱 파괴력이 컸다. 2002년 청양과 예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1000만평에 가까운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피해액만 2646억원에 이르렀다. 복구기간까지 주는 피해액과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피해를 합산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는 우선 동식물과 어류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 갑천에서 헤엄치던 미호종개와 유등천의 감돌고기는 지속적인 환경오염과 개발논리에 휘둘려 보금자리를 잃어 1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지 오래다. 하지만 보호를 위한 관련조례나 서식지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설정도 돼있지 않다.
미호종개의 서식지는 대전서남부 개발권 내에 포함됐고 호남고속철도의 통과도 예정돼 있다. 현재는 중단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이 재차 추진되면 아예 멸종될 지도 모른다.
텃새로는 1974년 멸종됐다가 18년만인 1992년 12월 천수만에서 서식이 발견돼 우리나라에서는 충남에서만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황새도 주변오염이 심화되면서 언제 둥지를 옮겨갈지 모를 일이다. 이는 우리주변에 흔히 볼 수 있던 뜸부기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 파괴는 이제 인간들에게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충청지역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1969년부터 35년 동안 연평균 기온은 무려 1.31℃ 올랐다. 땅 덩어리가 달궈지고 있는 것이다. 서해의 바닷물 온도도 30년 동안 1℃나 상승했다.
기온상승은 생태계에 변화와 함께 예기치 못한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 국지성 폭우의 발달이 대표적인 예이며, 온대성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환경변화의 대표적 영향으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팽창 억제와 온실가스 농도 저감계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터널공사로 위협받고 있는 계룡산국립공원 실태보고’를 통해 교각 및 터널공사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그 속에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제 진부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진부한 말만큼 많은 진리를 담은 경구(警句)도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맹창호. 사진=지영철·이민희 기자
맹창호. 사진=지영철·이민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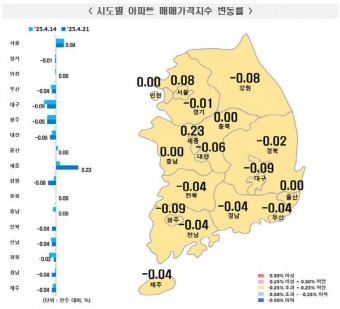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