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한 괭이 두 마리 놓고 갑니다. 찾는 손님들에게 관절염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권해주슈.”
도시 쓰레기더미 주변에 덫을 놓아 잡은 고양이를 팔고 있는 사내는 걸머지고 온 자루를 섬돌 위에 집어던지고는 어깨에 어둠을 가득 짊어진 채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아, 앙, 앙앙….”
섬돌 위 어둠이 꾸물꾸물 움직이며 사내가 내던진 자루에서 새어나온 고양이 울음이 양철집을 싸고돌았다.
“목줄을 따 뒤뜰에 던져 놓을 것이지. 남의 방 앞에….”
자루 속 바둥대는 그 울음소리가 방안에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누운 김인구의 귓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또 모포를 입에 물고 돌아누웠다.
“으앙! 앙앙앙!”
이리 누우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누우면 저리 따라오는 그 울음소리를 인구는 몇 년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서였다. 피조개 같은 입술을 벌린 채 눈을 감은 그녀에게 입을 갖다댈 때면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르는 그런 교성을 내곤 했다.
그때 가슴봉우리라도 지그시 눌러주면 그녀는 숨까지 막히는 듯 자스민 향을 토해내기도 했었다.
다시 고양이의 버둥거리는 소리는 끈적끈적 인구의 귀청에 달라붙고 있었다. 이제 고양이의 신음은 인구 피부 속 숨은 핏줄을 불러냈다.
그는 모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아랫도리 남성을 움켜쥐었다. 인구는 그녀와 헤어진 후 일어설 줄 모르는 슬픈 고깃덩어리를 욕지거리를 뱉으며 흔들어 댔다.
“아작 아작 씹어 먹을 년! 신라면 끓일 때 대파와 함께 숭숭 쓸어 넣어 먹을 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글=이창훈 / 그림=송정훈
글=이창훈 / 그림=송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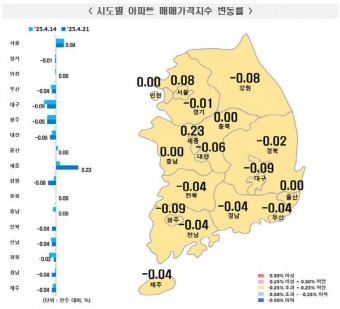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